[이봉수칼럼] 가장 많은 이름이 ‘관계자’ ‘아무개’?…‘익명의 편의’ 빠지지 말아야
정치인·재벌 익명 요구 엄격히 대응…‘실명 보도’로 존재감 높이길

맬서스의 <인구론> 초판은 1789년에 익명으로 출판됐다. 인류의 미래를 지나치게 암울하게 본 책의 내용과 논리 구성에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실명을 뺀 것이다. 실제로 4년 뒤 출판된 2판에서는 실증적 자료가 보완되고 주장이 좀 누그러지는데, 저자가 실명으로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인구론>은 6판이 나올 때까지 28년간 당시 출판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수정보완을 거듭해 명저가 된다. 그가 그냥 익명을 고수했다면 그런 수고를 했을까? 빵집을 하나 내도 자기 이름을 상호로 내거는 이는 품질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한겨레>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 이름’은 뭘까? 검색해보면 ‘관계자’와 ‘아무개’일 것이다. ‘ㄱ’ ‘ㄴ’ ‘ㄷ’ 따위 머리글자(이니셜)로 표현되는 사례도 너무나 많다. 물론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는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이 필요한 때도 있다.
그러나 기자가 부실한 취재를 감추는 수단으로, 또는 취재원과 유착돼, 아니면 습관적으로 익명을 남발한다면, 보도의 신뢰도가 문제된다. 신정아씨도 자서전에 유명인의 실명을 밝힌 이유가 신뢰도 때문이라 하지 않았던가? 익명 보도는 독자의 알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다음 사례들은 어디에 해당할까?
송영선 전 의원이 사업가 ㄱ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19일 보도한 것은 <한겨레>의 큰 특종이었다. ㄱ씨는 제보자이니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한겨레>는 20일과 21일 후속보도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ㄱ씨가 25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친박계 ㅎ씨’에 대해서도 끝까지 익명을 유지한다.
그러면 ㅎ씨에 대한 익명 보도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한겨레> 보도를 보면 그는 2007년에 박근혜 후보 지지조직인 ‘한강포럼’과 비선조직인 ‘마포팀’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어서, 현재 대선 국면에서도 후보검증과 관련해 비중 있는 ‘공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적도 있으니 검색해보면 금방 이름을 알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매체들은 ㅎ씨의 실명을 밝혀버렸다. <한겨레>가 정한 ‘범죄 수사 및 재판 취재 보도 시행세칙’에 따르더라도, 실명·초상 등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고위공직자나 사회 저명인사’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예외인 사람에게 일반 원칙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시민편집인이 보기에, 무리한 익명 처리 기사는 ‘모니터링 일지’에 지난해 5월 이후 적힌 것만도 20여건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6일 <한겨레>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기관에 대거 취업한 것을 보도했는데, 모두 익명이었다. 그 기사는 하루 전 <조선>이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었는데, <중앙> <동아>가 역시 실명으로 기사를 받은 반면 <한겨레>는 굳이 익명으로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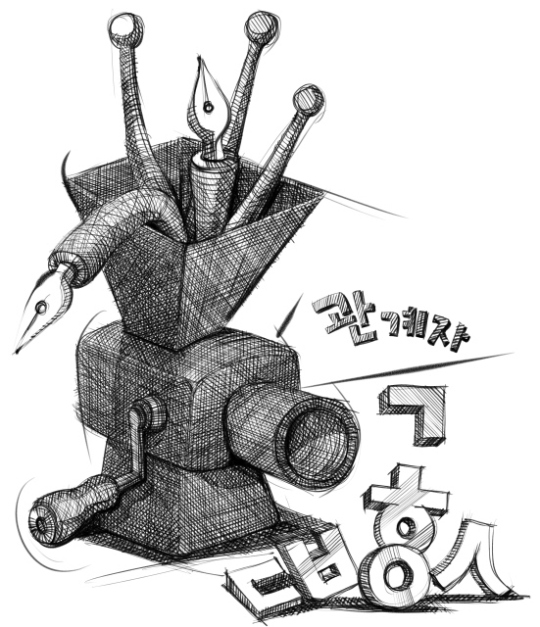
지난해 11월4일에는 등록금과 교수들 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선> <중앙> 등이 대학 이름을 상당수 밝혔지만 <한겨레>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달 이상득 의원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에는 언론들이 한동안 ‘정권 실세’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대신했는데 <한겨레>도 동조했다.
같은 해 <한겨레> 12월16일치 ‘이사장은 발전기금 챙기고, 총장은 공사 뒷돈’ 기사에는 각기 다른 ‘아무개’가 6명이나 등장한다. 대학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으니 독자로서는 ‘신문을 왜 보느냐’는 불만이 나옴직하다.
‘관계자’ 등 익명을 남발하는 기사 작성이 습관이 되어버린 느낌도 든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일본에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8월31일)를 예로 들면, “(외교통상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라는 대목이 나온다. 기사 옆에 물린 사진에 일본대사관 참사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미루어 기사의 익명 처리가 의도한 바는 아닌 듯하다.
권력기관이나 정치인들이 익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좀 엄하게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익명 뒤에 숨어서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언론 플레이’에 언론이 놀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은 ‘무책임 정치’의 수단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준석씨도 토크쇼에서 “언론 응대법을 많이 배웠다”며 “익명을 요청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대변인들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도 ‘관계자’ 등으로 보도되기를 바라는 관행은 한국 언론이 만든 악습이다. 민주주의 선진국 정부 대변인들은 기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국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하고 익명 뒤에 숨는 일도 거의 없다. ‘청와대, ‘내곡동 특검’ 거부권 결정 늦어질듯’ 기사(18일)에서 발언의 주체는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돼 있다. 기자들에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개 홍보수석으로 통하지만 일반독자들은 알기 어렵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익명을 이용한 ‘봐주기’식 보도가 많이 눈에 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국적 세탁’을 했다는 기사(15일)에는 재벌 이름들이 머리글자로만 남았다.
과거 <한겨레>는 여느 언론과 달리 실명 보도를 고집스레 실천함으로써 기득권층과 불화했지만 존재감을 드러냈다.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 사건이 가까운 사례다. 한화그룹의 로비로 모든 언론이 익명으로 조그맣게 보도할 때 <한겨레>는 회사는 물론 김 회장까지 실명으로 3개 면에 펼쳐 보도(4월27일)함으로써 영향력을 과시했다. 권위지의 위상은 불필요한 익명 보도를 자제하는 데서 상당 부분 확보된다.
* 이 기사는 <한겨레>와 동시에 실립니다.
* 이 기사가 유익했다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