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흔든 책] 더 저널리스트: 어니스트 헤밍웨이
더 저널리스트: 어니스트 헤밍웨이/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김영진 엮고 옮김/한빛비즈/1만6000원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기자 시절에 작성한 기사 25편을 담은 책이다. 헤밍웨이의 기사는 대개 인물이나 특정 상황을 묘사하며 시작한다. 나머지 내용은 헤밍웨이가 목격하거나 겪은 장면들로 채워진다. 기사를 읽으면 헤밍웨이가 본 현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소설을 읽는 느낌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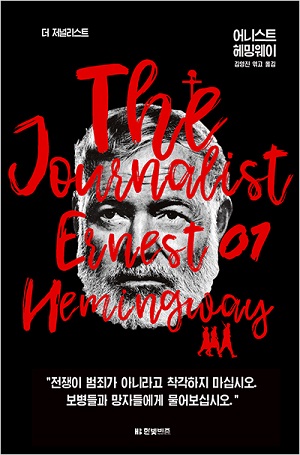
헤밍웨이가 쓴 기사는 ‘문학 저널리즘’에 속한다. 문학 저널리즘은 문학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차용하되 사실만 다루는 보도 형태다. 문학 저널리즘의 뿌리는 찰스 디킨스, 마크 트웨인, 조지 오웰 등이 이어온 사실주의 문학에 있다. 사실주의 문학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를 충실히 묘사하는 객관적 인식을 중시한다. 헤밍웨이는 사실주의 문학의 계승자다. 그는 19살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원입대해 포탄 파편과 총상으로 다쳤다. 23살 때는 해외 특파원으로 그리스-터키 전쟁을 보도하면서 피난민 행렬을 목격했다. 두 경험은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에 녹아있다. 또한 헤밍웨이는 스페인 내전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집필했다. 헤밍웨이가 35세 때 낚싯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경험은 <노인과 바다>에서 바다 위 모습을 묘사할 때 도움이 됐다. 헤밍웨이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묘사해 기사로 쓰고, 진실에 가까운 상상은 소설로 썼다.
장면 너머의 진실
문학적 기법으로 독자에게 생생히 전달된 사실은 진실을 보는 기반이 된다. 이는 헤밍웨이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헤밍웨이는 전형적이지 않은 장면들을 포착해 전쟁의 참상을 전달했다.
용기의 값은 얼마일까? 아델레이드 스트리트에서 훈장과 동전을 매입하는 상점 점원이 답한다. “저희는 매입 안 해요. 그런 건 수요가 없어요.”
“훈장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기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매일 와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 전쟁에서 받은 훈장은 사지 않아요.”
‘전쟁 훈장 팝니다(War Medals for Sale)’
<토론토 스타 위클리(Toronto Star Weekly)>, 1923년 12월 8일
그리스-터키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23년 헤밍웨이가 보도한 기사의 첫 부분이다. 이후 내용은 이렇다. 헤밍웨이는 중고품 상점 8곳을 돌며 훈장을 취급하는지 물었다. 훈장을 사들인다는 상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상점 주인들은 훈장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참전 용사가 아니라 ‘쓸모없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했다. 당시 전쟁이 끝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귀향 군인들은 급전을 빌리기 위해 훈장을 사용했다고 한다. 위 기사는 전쟁 이후 사회 모습이 어떤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훈장을 취급하지 않는 상점들을 그려내 당시 사회와 전쟁의 실체를 드러낸다.
삶이 곧 진실의 현장
헤밍웨이는 권력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부터 진실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는 프랑스 수상을 지낸 조르주 클레망소에 관한 기사에 잘 나타난다. 클레망소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강력한 전면전을 주장한 정치인으로 한때 ‘승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클레망소의 정치적 위상은 떨어졌다. 헤밍웨이는 이 현상을 취재했다. 다만, 정치인을 인터뷰하는 대신 거리의 카페를 찾았다.
정치인이 애써 숨기려 해도 대중은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정치인을 구설에 올리는 법이다. 카페에서 만나는 프랑스인들은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보니 대체로 자신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 선거 결과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듣는 간접 증거가 아니라 프랑스 국민의 입을 통한 국민적 정서 말이다.
‘프랑스는 싸움꾼이 아니라 건축가를 원한다
(Builder, Not Fighter, Is What France Wants)’
<토론토 데일리 스타(Toronto Daily Star)>, 1922년 2월 18일
헤밍웨이는 카페에서 나눈 대화와 프랑스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기사에 담았다. 정치인의 말을 옮겨 적기보다 시민의 생각을 정치인에게 전달한 셈이다. 다른 기사에서는 전쟁 중 다친 군인과 사망자의 모습을 그리며 권력자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가린 전쟁의 진실을 밝힌다. 헤밍웨이는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진실을 보았다.
글쓰기는 진실을 말하려는 사투
헤밍웨이는 글 쓰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고민은 “어떻게 진실만을 말할까, 무엇이 진실인지 깨달은 후에 이것을 어떻게 글에 녹여내어 독자의 삶 일부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위 고민에 답이 될 만한 내용이 실려 있다. 1935년 잡지 <에스콰이어(Esquire)>에 헤밍웨이가 쓴 기사인데, 자신을 찾아온 작가 지망생과 글쓰기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 헤밍웨이는 경험으로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진실에 가깝게 상상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다음에 무슨 대답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몰입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에 글을 얼마만큼 써야 하는지도 알려줬는데, 헤밍웨이는 이를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팁’이라고 했다. 그 내용을 이 기사에는 쓰지 않겠다.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 헤밍웨이의 가장 소중한 팁까지 읽고 책장을 덮으면 깨닫게 된다. 소설처럼 술술 읽히지만 오직 진실을 중심에 둔 그의 글이야말로 진짜 기사다.
| 100자평 기자 헤밍웨이의 삶이나 문학 저널리즘의 정체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책 말미에 실린 헤밍웨이의 글쓰기 수업 내용은 덤. |
편집: 유재인 기자
단비뉴스 미디어콘텐츠부, 청년부, 시사현안팀 이예진입니다.
용기로 오늘을 성실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