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인터뷰] 언론상 휩쓰는 김성광 <한겨레> 기자
6년 남짓한 기자 생활 중 거의 매년 굵직한 기자상을, 그것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받은 사진기자. 사진취재는 물론이고 기사도 쓰며 영상도 제작하는 멀티 플레이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우리 집 막둥이’로 부르며 빵을 챙겨주는 청년. 모두 김성광(33) <한겨레> 기자를 설명하는 말이다.
화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를 조명한 ‘불타버린 코리안드림’으로 지난해 노근리평화상(노근리국제평화재단), 민주언론상 특별상(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상(한국기자협회) 등을 거머쥔 그를 지난 5월 3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고 지난달 전화 등으로 추가 인터뷰했다.
남의 고통 보며 일하는 직업, “일단 말리고 싶다”
“기자가 되겠다고 하면 일단 말리고 싶어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기사도 사진도 일종의 ‘스토리와 이미지 착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취재해야 하고 취재원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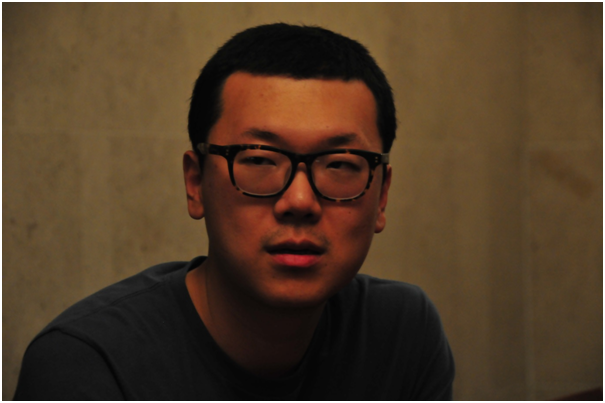
그가 ‘남의 고통을 보며 일한다’고 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입사한 지 6개월 만인 2014년 4월 그는 전남 진도 세월호참사 현장으로 파견됐다. 울부짖고 쓰러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야 했다. 신문·방송사들이 ‘전원 구조’라는 대형오보에 이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취재 경쟁으로 지탄을 받던 때였다. '기레기들아 취재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기자야'란 독설이 그의 가슴을 후벼팠다. 희생자 가족들 앞에 서면 눈물부터 나와서, 카메라 없이 그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 기자는 유가족의 칠순 잔치나 졸업식에 가서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어 주는 등 가족처럼 다가갔다. 나이 든 유족이 ‘우리 집 막둥이’로 부를 정도로 스스럼없는 사이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의 처절한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보도 사진들이 나왔다. 단원고생 박성복군의 장례식과 세월호 현장 등을 담은 ‘그리운 아들’은 2015년 일본 사진전문지 <데이즈재팬>의 ‘데이즈 국제보도사진상’ 특별상과 한국보도사진전 우수상을 받았다.

지뢰사고·산업재해 피해자 끈질기게 조명
‘고통을 마주하는 작업’은 김 기자가 자초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언론이 외면한, 혹은 실패한 현장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한다. 2015년 6월 <한겨레>에 보도된 ‘지뢰받이 이경옥’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지뢰사고 피해자를 8번이나 찾아간 끝에 원고지 60매 분량의 사연과 사진을 지면에 올린 것이다. 이경옥씨는 젊은 기자의 진정성에 감복, 네 번 자살을 시도했던 아픔과 의족 속 맨 다리를 사진기 앞에 드러냈다.

김 기자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고통을 전달하는 일에도 남다른 열의를 쏟고 있다. 4년 가까이 휴가를 포기하고 사재를 털어 취재한 끝에, 2017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담은 ‘불타버린 코리안드림’과 ‘산재 당하고 한국 떠난 노동자 딜란타’를 내놨다.
지난 1월에는 다른 언론사 기자 5명과 함께 산재 피해 등을 조명한 사진 전시회 ‘구경꾼’을 열기도 했다. 그가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전기 노동자 등으로 일했던 아버지가 고압선 공사 중 목숨을 잃을 뻔 하는 등 산재 피해를 여러 번 겪은 영향도 있다고 한다.

독하게 배운 사진, 글쓰기·프로파일링에도 욕심
경희대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한 김 기자가 ‘포토저널리스트’를 꿈꾸게 된 것은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취업휴가)를 갔을 때 사진 공유사이트 ‘게티 이미지(getty images)’에서 인상적인 작품들을 접하면서부터였다. 독학으로 사진 기술을 익히고,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씨의 지도를 받으며 아마추어 프리랜서로 뛰던 그는 아직 대학생이던 2010년 미얀마에서 가택 연금이 막 해제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사진을 찍어 국내 일간지에 싣기도 했다. 중국에서 농민공(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빈곤층 노동자)을 취재하다 공안 당국에 쫓긴 일도 있고,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와 캄보디아 마약거래 현장 등에서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취재한 경험도 많다.
그는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에 ‘fly(날다)’를 넣어서 쓰는데, “앞으로 어떤 플라이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몸을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다.
“대학생 시절 프리랜서로 돌아다닐 때, 내 사진엔 한국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국내 기자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깊은 로컬(지역)스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되고 싶어서, 언론진흥재단의 관련 수업도 들었어요.”
김 기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가기 위해 프로파일링(인물 유형 분석) 공부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진기자들은 다 키보드(자판)를 잡아야한다'는 <뉴욕타임스> 사진부장 제임스 이스트린(퓰리처상 수상)의 말을 인용하며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디지털영상부문 탐사다큐팀에 소속된 그는 최근 인터뷰 영상과 사진, 글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원보이스(One Voice)’시리즈를 선보이며 멀티미디어 도전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편집 : 김유경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신수용입니다.
By doubting we come at the truth.

